
이산호<수필가/ (사)국제문인협회 감사>
“야, 오늘 보니 너 똥배 많이 나왔구나!”
모임에서 초등학교 동창 하나가 갑자기 대화의 화살을 나에게 돌리며 큰 소리로 뜬금없이 내뱉은 말이다. 둘러앉은 친구들이 하던 대화를 멈추고 시선을 약간 불룩하게 내민 내 불쌍한 배로 모은다. 난 무슨 실수라도 한 것처럼 찔끔한 기분으로 허리를 당겨 앉았다. 친구들의 시선에 갑자기 부끄럽고 당황해져서 이 어색한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난감해졌다.
“응... 요즘 배가 많이 나와서 고민하고 있는 중이야.” 얼떨결에 변명을 하고나서도 불편한 마음은 가시지 않고 기분은 마냥 가라앉아 버렸다. 그 친구는 금방 언제 그런 말을 했느냐는 듯이 다른 화제로 돌려 침을 투기며 열을 올리고 있었다. 나는 내내 그 분위기에 어울리지 못하고 불쾌한 마음은 가셔지지 않았다.
‘나도 저 친구 흉을 좀 보아 망신을 줄 걸 그랬나?’
나만 기분이 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좀 억울한 마음이 생겼다. 그 친구는 머리가 많이 빠져 정수리가 훤하게 드러나 있는데 그걸 가지고 복수(?)를 할까 하다가 그만 내 옹졸한 생각에 피식 웃음이 나왔다.
‘참, 유치하다, 유치해! 똑같은 사람이 되려고?’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고개를 젓고 말았다.
어릴 적부터 좀 마른 편이어서 살찌는 것이 큰 소원이었다. 그때는 워낙 먹을 것이 귀하고 가난하던 시절이라 요즘 TV에서나 볼 수 있는 북한 사람처럼 광대뼈가 나온 마른 사람들이 일반적이었다. 뚱뚱하거나 배가 나온 사람은 부자이거나 돈 많은 사장으로 인정해주어서 대우를 받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던 때였다. 그런데 나는 나이가 들어 먹을 것이 풍성해지고 삶에 여유가 있게 되었지만 아무리 잘 먹어도 도무지 살이 붙지 않았다. 40대가 될 때까지는 삼겹살도 실컷 먹어보고 일부러 과식을 해도 여전히 날씬한 몸매는 변하지 않았다. 나름대로 ‘살찌기 작전’을 해보아도 전혀 효과가 없어 아마도 살이 찌지 않는 마른 체질을 타고난 모양이구나 하고 체념을 하고 살기로 했다.
그런데 50대가 되고 나서는 슬슬 체중이 늘고 배가 나오기 시작했다. 평생소원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원하지 않던 배가 나오니 불편한 점도 생겨났다. 우선 바지 허리가 맞지 않아 입을 옷이 마땅치 않아 옷을 새로 장만해야 했다. 혈압도 높아지니 이건 아니구나 하고 이제는 운동을 해서 배가 들어가도록 해야겠다고 다짐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걷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는 중이었다. 그런 중에 하필 말을 험하게 하기로 유명한 친구의 표적이 되어 여러 친구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게 된 것이다.
어릴 때 코가 뾰쪽하고 눈이 왕방울만큼 커서 서양사람 같다는 말을 많이 들으며 자랐다. 성격적으로 예민했던 나는 그런 말이 찬사가 아니라 놀리는 말로 들려 듣기가 싫었다. 어느 날 사촌누나가 “넌 얼굴이 눈하고 코밖에 없는 것 같다.”라는 말을 듣고 노여움이 불현 듯 일어 그 이후로 그 누나를 똑바로 쳐다본 적이 없었다. 장난삼아 속없이 한 말이었겠지만 나를 이상하게 생긴 사람처럼 말한 그 누나와는 평생 서먹한 사이가 되고 말았다.
‘들은 귀는 천년이오, 말한 입은 사흘이다’라는 속담이 새삼 실감이 나는 일화이다.
우리는 가까운 사이라고 여길수록 아무렇지 않게, 그리고 생각해준다는 마음에서 신체적 특징이나 건강상태에 대해 지적을 해주는 것을 친근감의 표현이라 생각한다. 대학 다닐 때 한 여학생이 했던 이야기가 떠오르면 지금도 웃음이 나오려고 한다. 그녀는 얼굴이 동그랗고 예쁘장하게 생겨서 남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전에는 어른들이 여자 아이를 칭찬해주는 말로 “너 참 얼굴이 둥글납작하니 예쁘게도 생겼구나!”라고 하면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며 칭찬해주곤 했다. 이 말은 그 시절에는 예쁘고 귀엽다는 자연스러운 표현이었는데 그 학생은 그 말만 들으면 그렇게도 속상해져서 다시는 그 말을 한 사람을 가까이하지 않고 잘 쳐다보지도 않았다고 한다. 얼굴이 너무 동그란 것도 늘 마음에 걸렸는데 거기에다가 ‘납작하다’라는 표현은 죽고 싶을 만큼 혐오스러운 말로 들렸다는 것이다. 하긴 요즘 처녀 보고 옛날 농촌에서 흔히 하던 덕담대로 ‘맏며느릿감처럼 생겼다,’라고 한다면 어떤 기분이 될까? 남자처럼 튼튼해서 힘이 세고 애 잘 낳게 엉덩이가 풍성하다는 표현일 텐데 그 말뜻을 이해하는 처녀라면 무척 기분이 상해질 것이다.
살아오면서 들어서 잊지 못하고 가끔식 생각나는 언짢은 말들이 있다. 그런데 그 말이 생각나면 동시에 그 말을 한 사람의 얼굴도 내 기억 속에 부정적인 이미지로 선명하게 떠오르곤 한다.
마음 상하는 일이 있어 잠을 설치고 피로에 지친 날,
“오늘 보니 너 참 많이 늙었구나, 폭삭 삭은 얼굴이야!”
여름이 되면 잠시만 햇빛에 노출되어도 금방 타버리는 피부 때문에 햇빛 노이로제에 걸릴 정도의 나에게,
“얼굴이 많이 검어졌네. 혹시 간이 안 좋은 것 아니야? 빨리 병원에 가서 검사받아보지.”
그런 말을 듣고 나면 자연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도 속으로 심술스러운 생각이 솟구치곤 한다.
‘나 늙는데 뭐 보태준 거라도 있어? 그리고, 내가 죽을병이 들었다면 자기가 뭘 도와주기나 할 건데?’
‘말이 입힌 상처는 칼이 입힌 상처보다 깊다.’라는 옛말이 있다. 말 한마디가 삶을 활기차고 살맛나게 해주는 마력을 지니고 있지만, 또한 영원히 잊히지 않는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한다. 특히 남의 신체적 특징이나 건강상태 등을 배려하는 마음 없이 함부로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우리 문화에서는 대화 상대방에게 ‘퉁퉁해졌다’ ‘살쪘다’ ‘몸이 불었다’ 같은 말은 쉽게 한다. 그러나 서양에서 상대방에게 ‘fat’라는 표현을 간접적으로도 쓴다면 ‘ugly’라는 말로 받아들여 그 관계는 아주 불편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 누구나 자신에 대한 일은 자기가 가장 잘 알고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표현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
이제 나와 마주 대하는 사람을 기운이 나고 즐겁게 해줄 수 있는 말을 생각해보자, 자연스럽고 진솔하게 칭찬해주고 격려를 해 준다면 누구나 그런 사람을 좋아할 것이고 다시 만나 즐거운 시간을 함께하고 싶어질 것이다. 찾아보면 아름다운 표현이 다양한 우리말로 누구에게나 칭찬해 줄 말은 무궁무진하게 많다.
구독 후원 하기
- 독자 여러분의 구독과 후원은 주간고령의 가장 큰 힘 입니다.
- 정기구독 / 일시 후원금액 : 자유결재
- 지면 평생 구독 50만원 / 연간 구독 5만원 / 월 구독 5천원
- 농협 301-0218-8409-31 주간고령
계좌번호 복사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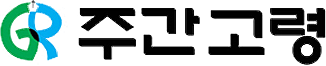



![[ 포토뉴스 ] 우곡면민 한마음축제 [ 포토뉴스 ] 우곡면민 한마음축제](http://www.weeklygr.com/data/file/news/thumb-662292049_73GUMhAr_d0a629b314c19e547601fbdba1fe21f8934d6b2a_190x1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