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정식(수필가/‘국제문예’ 수필부문 등단)
한 달 전, 아파트 단지에 운영 중인 휘트니스 센터에 등록했다. 주로 러닝머신에서 30분을 뛰는 것으로 시작해서 조금씩 시간을 늘리는 정도인데 1시간 동안 스피드 6~7을 놓고 뛰고 걷기를 반복한다. 1시간이면 대략 420칼로리가 빠진다. 이 모든 것은 오늘 치러질 건강검진에서 흡족한 결과를 얻기 위함이다. 나는 매년 의무적으로 한번 받게 되는 직장 내 검진에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 그도 그럴 것이 몇 년 전부터 결과 지표에 굵고 붉은 글씨로 정상치를 벗어난 숫자가 조금씩 늘어났기 때문이다.
드디어 1년에 한 번인 그날이 왔다. 어젯밤 이후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다. 세월이 갈수록 느끼는 면도날 두려움인가. 예전에는 대수롭지 않던 지표들이 나이가 들면서 그날이 다가오면 범위에 들까 벗어날까 궁금하기도 하지만 혹여 몸을 잘못 관리하지는 않았나 하는 두려움이 앞선다. 제발 예년 정도의 결과치라도 나왔으면 좋겠다.
건강 보건센터의 간호사는 아무렇지도 않은 무표정한 얼굴이다. 오른 팔뚝을 혈압측정기에 넣으세요, 버튼을 누르자 혈관이 막힌 듯 뻐근한 통증에 팔이 저려온다. 140을 넘을까 작은 움직임에 혹시 수치가 오르지는 않을까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쓰지만 몸이 서서히 굳는다.
심전도 측정은 더 긴장된다. 신발 벗고 침대에 올라서기 무섭게 가슴팍이며 발목에 자석 같은 장비를 척척 채운다. 심장 박동이 마구 치솟는다. 초록색 화면에는 알 수 없는 그래프가 파형을 그리다가 삐~ 소리를 내며 멈춘다. 높낮이가 완만한 것을 보니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당장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닌데 일희일비하면서도 안도의 한숨이 나온다.
심전도 측정은 더 긴장된다. 신발 벗고 침대에 올라서기 무섭게 가슴팍이며 발목에 자석 같은 장비를 척척 채운다. 심장 박동이 마구 치솟는다. 초록색 화면에는 알 수 없는 그래프가 파형을 그리다가 삐~ 소리를 내며 멈춘다. 높낮이가 완만한 것을 보니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당장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닌데 일희일비하면서도 안도의 한숨이 나온다.
정수리를 한 대 툭 치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제 자리로 간다. 힘껏 들이켠 숨을 아주 길게 날숨으로 분다. “더더 더 조금만 더더 더…” 폐활량 측정은 젖 먹던 힘까지 다해야 겨우 성공이다. 마지막까지 불고 나면 순간 고통이 밀려오고 어지럼증을 느낀다.
밀폐된 공간에 앉아 음악이 나오지 않는 헤드폰을 정성껏 착용한다. 세상의 소리는 차단되고 내 숨소리만 가랑가랑 들린다. 콧속에서 나온 콧바람이 마스크에 한 번 달구어져 안경알이 희미하다. 알 수 없는 외계어 같은 전자음이 귓속을 헤집고 들어 온다. 나는 그들과 싸워 조금이라도 데시벨(db)을 낮추어야 한다. 가끔 숨을 멈춰야 하고 전자음을 내 귓속에 가두기 위해 고도의 집중과 몰입을 한다. 미세한 소리가 들릴 때는 직감적으로 옳다구나 버튼을 누른다.
어릴 적 백일해와 잦은 감기로 왼쪽 귀를 앓는 날이 많았다. 귀에는 늘 고름이 흘러나와 초등학교 시절에는 솜을 귀에 틀어막고 다녀야 했다. 한 번씩 아파질 때는 읍내 약국에 가서 ‘테라마이신’이라는 항생제를 먹고 며칠 앓은 후에야 겨우 낫기도 했다. 결국 성인이 되어 중이염 수술을 하였다. 그러기에 왼쪽 귀는 특별히 조심해야 한다.
어릴 적 백일해와 잦은 감기로 왼쪽 귀를 앓는 날이 많았다. 귀에는 늘 고름이 흘러나와 초등학교 시절에는 솜을 귀에 틀어막고 다녀야 했다. 한 번씩 아파질 때는 읍내 약국에 가서 ‘테라마이신’이라는 항생제를 먹고 며칠 앓은 후에야 겨우 낫기도 했다. 결국 성인이 되어 중이염 수술을 하였다. 그러기에 왼쪽 귀는 특별히 조심해야 한다.
엑스레이실로 들어선다. 갈비뼈와 가슴팍을 붙이고 숨을 들이마신 후 숨을 멈추어야 한다. 포승줄에 묶인 듯 두 손을 뒤로한 채 기다리다 보면 ‘철컥’ 흑백 필름에 내 몸의 장기들이 기록될 것이다. 종이컵에 ‘14203’이라는 번호를 적어 노르스름한 액체를 반쯤 채우고 흘리지 않게 지정 장소에 놓는다.
간호사는 노란 고무줄로 오른팔 알통을 묶는다. 탁탁! 팔꿈치 안쪽을 두어 번 톡톡 건드려 피부색 변화를 보고 힘줄을 찾는다. “따끔합니다” 대답하기도 전에 붉은 피가 주사기 대롱 속으로 쭈욱 빨려든다. “문지르지 말고 3분 정도 꾹 눌려요” 구멍 난 핏줄을 감싸줄 동그란 밴드 하나를 챙겨준다. 이 피는 내 몸의 상태를 분석할 수 있는 귀중한 시료가 될 것이다.
간호사는 노란 고무줄로 오른팔 알통을 묶는다. 탁탁! 팔꿈치 안쪽을 두어 번 톡톡 건드려 피부색 변화를 보고 힘줄을 찾는다. “따끔합니다” 대답하기도 전에 붉은 피가 주사기 대롱 속으로 쭈욱 빨려든다. “문지르지 말고 3분 정도 꾹 눌려요” 구멍 난 핏줄을 감싸줄 동그란 밴드 하나를 챙겨준다. 이 피는 내 몸의 상태를 분석할 수 있는 귀중한 시료가 될 것이다.
“아아!” 입을 벌린다. 은빛 금속탐지기로 윗니, 아랫니를 훑는다. 내 의지대로 할 수 없는 시간이다. 이제 최종 관문인 의사를 만나 건강상담만 남았다. 그동안 한 번도 요청하지 않았던 ‘전립선 초음파’와 ‘심장 초음파’를 사외진료를 요청하니 의사 선생님께서 흔쾌히 응해 주었다. 드디어 모든 과정이 끝났다. 빵 하나 우유 하나 티켓을 받아서 들고 매점에 들러 허기를 채운다. 건강검진은 대략 30여 분, 1년에 한 번은 비켜날 수 없는 내 몸과의 전쟁 날이다. 그러나 이제 이것도 한번 남았다. 내년이면 정년퇴직이니 어느덧 직장생활도 서서히 끝물이다.
공교롭게도 그날 저녁 뉴스에는 반가우면서도 씁쓸한 기사가 눈에 띈다.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83.5세, 그해 태어난 아이가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연수를 뜻한다. 남성 80.5세, 여성 86.5세로 각각 예측된단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가운데 우리나라 인구의 평생 기대수명이 10년 만에 19계단 뛰어올라 일본에 이어 2위라고 한다. 그런데 건강수명은 66세라고 하고 병든 채로 17년을 살아야 한다니 ‘장수(長壽)의 저주’에 빠지지 않도록 국가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나는 더 바랄 것 없다. 크게 아프지 않고 내 인생에 황혼이 왔을 때 남의 손 빌리지 않고 스스로 밥숟갈 들고 먹을 수 있고, 걷고, 자유로이 대소변 가리고, 사물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지각을 가질 수 있다면 좋겠다. 아직 젊은데 건강에 대해 이른 염려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며칠 후 받아서 들 ‘내 몸 사용서’에 대한 성적표는 어떻게 나올까?
수. 우. 미. 양. 가중에 ‘미(美)’를 받더라도 그저 감사할 일이다.
오늘은 1년에 한 번 내가 전쟁을 치르는 날이다.
<‘국제문예’에서 발췌>
수. 우. 미. 양. 가중에 ‘미(美)’를 받더라도 그저 감사할 일이다.
오늘은 1년에 한 번 내가 전쟁을 치르는 날이다.
<‘국제문예’에서 발췌>
구독 후원 하기
- 독자 여러분의 구독과 후원은 주간고령의 가장 큰 힘 입니다.
- 정기구독 / 일시 후원금액 : 자유결재
- 지면 평생 구독 50만원 / 연간 구독 5만원 / 월 구독 5천원
- 농협 301-0218-8409-31 주간고령
계좌번호 복사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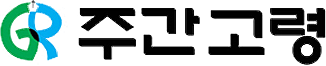



![[ 포토뉴스 ] 우곡면민 한마음축제 [ 포토뉴스 ] 우곡면민 한마음축제](http://www.weeklygr.com/data/file/news/thumb-662292049_73GUMhAr_d0a629b314c19e547601fbdba1fe21f8934d6b2a_190x1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