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말호<수필가>
칠월의 태양이 이글거리는 초복 날, 김 작가님이랑 문우님들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일찍부터 집을 나섰다. 시간도 있고 해서 수묵화를 그려놓은 자연을 감상하기 위해 고즈넉한 국도로 차가 달린다. 우리나라는 어디를 가든지 고속도로며 국도도 잘 돼 있어 편하고 좋았다.
김천으로 가는 길도 4차선 도로가 만들어져 고속도로보다 더 한가하고 조용하며 주위에 경관들도 감상하며 가니까 또 다른 느낌이 들었다. 전에 없던 김천 부항댐 출렁다리며 지나가는 길에 캠핑장도 보게 됐는데, 그 높이가 꽤나 스릴이 있어 관광객들이 많이들 찾아온다고 한다.
그러나 가뭄이 심해서 물이 줄어들어 바닥이 드러나고 있어 안타까움이 컸다. 장마철이라 해도 비는 조금 오다 땅이 젖기도 전에 그쳐 습도가 높고 후덥지근해 몸은 물에 젖은 솜방망이처럼 무겁기만 해도 길가에 배롱나무에는 가지마다 햇빛 알레르기처럼 붉은 반점이 돋아나더니 꽃망울이 불꽃같이 터졌다.
시원한 바람이 소매를 당겨 보는 듯 여린 나무줄기가 가볍게 흔들린다. 나는 더운 여름이 정말로 싫다. 그러나 좋아하는 꽃은 여름에 많이 핀다. 아름다운 꽃들을 봐야 하기에 참아야겠지만, 한창 피우고 있는 백일홍이며 그 곁에 가뭇없이 피고 지는 풀꽃 더미 냄새가 콧속으로 들어와 향기가 느껴져 무디어진 내 가슴에 잠시나마 더위를 잊을 수 있었다.
목적지에 도착하니 정 작가님이 반갑게 맞아주시며 곧이어 회장님, 고문님, 두 분도 도착했다. 산골이라 벌써 공기부터 달랐다. 깊은 산속에 이층 양옥 한 채와 마당에는 넓은 잔디가 깔려있고 입구에 작가님의 시비가 눈길을 끌었다. ‘산은 물, 물은 산’기념비 앞에서 세 사람이 사진을 찍고 들어가니 잔디에 작은 골프공이 뒹굴고 있고 사방으로 산이 병풍처럼 둘려져 있어 한 폭의 수채화를 본 것 같았다.
몇 해 전에 청량사에 갔던 기억이 떠오른다. 산세가 수려하고 다양한 비경을 간직한 청량산이며 대둔산은 한눈에 볼 수 있어 참 아름다운 산이라고 했더니, 다들 금강산 버금가는 영남의 ‘소금산’이라 부른다고 했다.
짙푸른 녹음 사이로 쉼 없이 흘러내리는 물소리, 새소리에 그동안 숨 가쁘게 살아가는 내 일상에도 잠시 삼매경에 빠졌던 일이 있었다.
옛날에 퇴계 선생님도 어릴 때부터 청량산을 좋아하셔 청량정사에서 공부했고, 훗날 벼슬길에 계실 때도 청량산을 잊지 못해 임금이 바뀔 때마다 어쩔 수 없이 부름을 받고 정사를 돌보다 나랏일이 안정되면 사직을 하고 청량산으로 돌아오셨다고 했다. 노후에 도산서원을 짓고 후학들을 가르치며 학자들과 성리학을 연구하고 청량산 맑은 물소리며 당당한 기품과 푸름까지도 사랑하시어 일생을 보냈다고 한다.
오랜만에 만나 주먹 악수로 인사를 하고 정 작가님이 계곡 위에 파라솔을 쳐놓고 식탁을 차려놓았다. 우리는 식탁에 둘러앉았다. 워낙 깊은 산골이라 그런지 더위가 싹 가셔지고 산 위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계곡 물소리는 완전히 무릉도원에 온 것 같았다.
나는 깊은 골짜기에서 흐르는 맑은 물소리에 어린애처럼 마음이 들떠 물속으로 뛰어가고픈 생각이 절로 난다. 산세 좋고 물 좋은 이곳에서 정 작가님은 시를 쓰고 글을 쓰면서 유유자적하며 풍류를 즐기시고 있는 모습에 부러움 마저 들었다. 고기를 구워서 막걸리랑 마시니까 주위 경관이 수려한 탓인지 술맛이 좋아 몇 잔을 마셨더니 취기가 올라 아래 계곡으로 내려갔다.
발을 담그고 물속을 들여다보니 작은 피라미들이 발 옆으로 모여들어 발 위를 톡톡 치며 지나다닌다. 김 작가님은 대구에서 출발할 때부터 고기 잡아서 어탕 라면을 끓여 먹으면 기가 막히도록 맛이 있다며, 오늘 솜씨 한번 보여준다고 자랑을 했었다.
옛날 젊은 시절 학생들과 냇가에서 고기 잡던 솜씨를 활용해 덫을 놓고 고기가 모여들도록 돼지고기로 미끼를 달아 물속으로 어항을 밀어 넣었다. 잠시 지나자 고기들이 돼지고기 냄새를 맡고 우르르 모여들었다. 어항 속에 큰 고기, 작은 고기가 많이 들어와 우글거렸다.
뜬금없이 반세기가 훌쩍 지나간 옛날 일이 떠오른다. 남편은 낚시를 좋아해 토요일만 되면 낚시하러 갔었다. 그때는 참깻묵을 얻어다 떡밥을 만들어 미끼로 초망 속에 넣어두면 고기들이 고소한 냄새를 맡고 몰려든다. 한나절 되면 초망 속에 수백 마리가 잡혀있다. 고기가 너무 많아 이웃에 고기를 나눠주고 남은 것은 매운탕 끓여서 세 들어 사는 사람들까지도 포식을 했던 기억이 되살아나면서 다시 한번 어항 속 고기들을 바라보았다.
큰 고기만 잡고 작은 고기들은 물속으로 놓아주었더니 꼬리를 흔들고 발끝을 톡톡 치며 지나간다. 큰 고기만 손질하여 어탕 라면을 끓었다. 일찍 가신 회장님, 고문님이 어탕 라면을 못 드시고 가서 무척 아쉬웠다.
인생은 영원하지 않기에 아름다운 오늘이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아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하고 싶다.
구독 후원 하기
- 독자 여러분의 구독과 후원은 주간고령의 가장 큰 힘 입니다.
- 정기구독 / 일시 후원금액 : 자유결재
- 지면 평생 구독 50만원 / 연간 구독 5만원 / 월 구독 5천원
- 농협 301-0218-8409-31 주간고령
계좌번호 복사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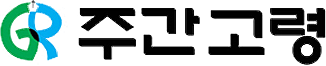



![[ 포토뉴스 ] 우곡면민 한마음축제 [ 포토뉴스 ] 우곡면민 한마음축제](http://www.weeklygr.com/data/file/news/thumb-662292049_73GUMhAr_d0a629b314c19e547601fbdba1fe21f8934d6b2a_190x1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