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유<시인·수필가>
어린 시절의 추억을 실은 긴 열차가 끝없는 평행의 철로 위를 뱀처럼 미끄러지며 달리고 있다.
강산이 여섯 번이나 변하는 오랜 세월이 흘렀건만, 옛날의 그 기찻길은 지금도 변함없이 한 자리를 지키며 육중한 열차의 무게를 견뎌내고 있다.
괴물같이 생긴 검은 증기기관차가 ‘칙칙폭폭’ 흰 콧숨을 내뿜으며 우렁차게 저 길을 달렸었고 붉은 머리의 디젤기관차는 내 어린 시절의 꿈을 싣고 들판을 가로질러 질주하다 산모퉁이 뒤로 꼬리를 감추곤 했다.
어린 우리에게 열차는 미지의 세계를 향해 달려가는 호기심과 희망의 상징이었다. 열차가 지나갈 때면 차오르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두 팔이 빠지도록 손을 흔들었고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렀다. 열차를 타고 어디론가 낯선 곳으로 떠나 보고 싶었다. 보릿고개로 모두가 배고프던 시절, 열차가 달려가는 먼 곳에는 먹을 것도, 볼 것도, 사람도 많은 풍요로운 세상일 것이라고 상상했다.
철길은 우리의 위험하고도 재미있는 놀이터였다. 선로에 엎드려 귀를 대고 열차 바퀴의 ‘딸그락’ 거리는 소리를 들으면 열차가 어디쯤 오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었다. 선로 위에 못이나 작은 쇠붙이에 침을 발라 올려놓고 열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바퀴에 눌려 납작해진 그것들을 돌에 갈아서 작은 연장이나 장난감을 만들기도 했다.
내 어린 시절의 철길에는 누렁이의 죽음이라는 슬픈 추억도 도사리고 있다. 어느 날 어머니께서 강 건너 이모 댁에 다니러 갔다가 노란 털의 강아지 한 마리를 안고 오셨다. 우리는 그 강아지를 누렁이라 부르며 한 가족처럼 보살피며 키웠고 나와는 온종일 붙어 다니는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다.
누렁이가 점점 성장하면서 우리는 밖으로 나가 쏘다니는 날이 많아졌다. 온 천지가 푸른색으로 생동하던 그해 봄날에도 누렁이와 나는 온종일 들판을 뛰어다니며 재미나게 놀았다. 보리밭의 종달새 알둥지를 찾아다니며 뒤지거나, 꿩 새끼들을 쫓으며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우리는 약자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하는 철없는 들판의 무법자였다.
정신없이 뛰고 달리며 노는 사이에 철길 근처에 다다르게 되었다. 멀지 않은 곳에서 열차가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마치 열차와 경기라도 하듯이 누렁이를 뒤에 둔 채 악을 쓰고 철길을 뛰어 건넜다. 위험천만한 순간이었다. 열차는 고함을 치듯이 경적을 울리며 빠른 속력으로 지나가고 있었다.
나를 따라오던 누렁이는 긴 열차에 가로막혀 버렸다. 나는 걱정이 되어 달리는 열차 바퀴 사이의 공간을 통해 누렁이 쪽을 바라보았다. 누렁이는 앞다리를 들었다 놓기를 반복하며 안절부절못하고 있었다. ‘혹시나 저 녀석이 겁도 없이 철길로 뛰어들면 어떻게 하나?’ 다급해진 나는 두 팔을 힘껏 가로저으며 제발 건너오지 말고 그대로 있으라고 소리소리 질렀다. 그러나 누렁이는 나의 간절한 바램도 저버린 채 달리는 열차 바퀴의 빈 공간 속으로 그만 뛰어들고 말았다. 혹여 나의 손짓과 외침을 빨리 건너오라는 신호로 잘못 받아들인 것은 아닐까? 차라리 열차가 지나갈 동안 철둑길 언덕 어딘가에 숨어 버릴 것을… 나는 무너지는 가슴을 안고 울먹이며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긴 열차가 지나가고 황급히 철길에 올라섰을 때 두어 번 침목(枕木) 사이로 솟구쳐올라 설렁거리다가 가라앉는 누렁이의 긴 꼬리를 볼 수 있었다. 나는 차마 누렁이의 비참한 주검을 확인할 용기가 없어 쏜살같이 집을 향해 달렸다. 그리고 누렁이가 열차에 치여 죽었다고 어머니께 말했다. 어머니는 한참 동안 나를 바라보기만 할 뿐 말이 없었다.
뒷집 친척 아저씨가 죽은 누렁이를 지게에 지고 와 탱자나무 울타리 옆에 묻는 것을 나는 멀리서 넋을 놓고 바라보았다. 그리고 누렁이는 나 때문에 죽었다고 괴로워하며 오랫동안 밤잠을 설치며 괴로워했다. 그 후 내가 성장하여 중학생이 될 때까지, 어머니의 완강한 반대로 우리 집에 강아지를 들여 키우는 일은 없었다. 그리고 누렁이에 대한 슬픈 추억도 세월 속에 묻히게 되었다.
붉은 머리의 화물 열차 한 대가 60여 년의 세월을 가로질러 천천히 지나가고 있다. 한순간이라도 빨리 내 품에 안기고 싶어 안달하며 열차 바퀴로 뛰어들던 누렁이의 잔영이 동영상처럼 나타났다 사라진다.
열차가 지나간 뒤, 가지고 간 막걸리 한 병을 배낭에서 꺼내 누렁이가 꼬리를 설렁거리며 삶을 마감하던 그곳에 뿌렸다. 어쩌면 누렁이의 영혼이 지금껏 나를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비록 말 못 하는 한 마리의 짐승이지만 나에게로 향했던 그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무심히 살아온 날들이 미안하고 죄송스러웠다. 이제 그의 영혼이 시끄러운 철길을 벗어나 영원한 안식처에서 평온히 잠들기를 빌었다.
끝없이 이어지는 먼 평행의 철길을 바라본다. 달려도 달려도 영원히 합일할 수 없는 운명의 길이다. 다가서면 또 그만큼 멀어지기만 하는 지난(至難)한 내 삶을 닮은 길이다.
오늘도 그때처럼 봄날의 아지랑이는 피어나고 내 가슴속의 종달새는 어린 시절의 꿈처럼 하늘 높이 날아오르고 있다.
구독 후원 하기
- 독자 여러분의 구독과 후원은 주간고령의 가장 큰 힘 입니다.
- 정기구독 / 일시 후원금액 : 자유결재
- 지면 평생 구독 50만원 / 연간 구독 5만원 / 월 구독 5천원
- 농협 301-0218-8409-31 주간고령
계좌번호 복사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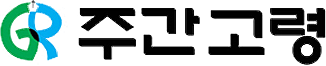



![[ 포토뉴스 ] 우곡면민 한마음축제 [ 포토뉴스 ] 우곡면민 한마음축제](http://www.weeklygr.com/data/file/news/thumb-662292049_73GUMhAr_d0a629b314c19e547601fbdba1fe21f8934d6b2a_190x1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