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상조(시인·소설가)
<지난호에 이어>
“저 혼자 있으니까, 구석구석 다 보고 가세요. 두 번 걸음 안 하시게요.”
신 선생의 능청에 경찰은 더 맥이 빠지는지 대충 훑어보고는 돌아가는 것 같았다. 느린 발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다가 대문 닫히는 소리가 났다. 이어서 차량의 엔진 시동소리가 나더니 차츰 고요해졌다. “목사님, 이제 나가서 저녁이나 챙겨 드시죠? 최소한 오늘 밤은 넘길 것 같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지.”
1층 거실로 내려온 두 사람에게 신 선생은 따뜻한 물을 한 잔씩 주었다. 두 사람은 약속이나 한 듯 잔을 들고 온기를 느끼기 위해 얼굴에 갖다 대다시피 하고 있었다. 좁은 공간에서 필요했던 것은 고상하고 이름 있는 차 한 잔이 아니고 온기 있는 물 한 잔이었던 것이다.
“오늘 신 선생이 오기를 정말 잘했어. 하나님이 길을 일러 주신 것 같아.”
유 목사는 신 선생의 눈치 빠른 일처리를 칭찬해 주었다. 실제로는 비서로서의 일을 하지만 ‘신 비서’라고 하지 않고 ‘신 선생’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남다른 일처리 능력 때문이었다.
“저는 이 일이 빨리 끝나고 예전의 금수원을 빨리 되찾고 싶어요. 그래서 목사님과 함께 우리 신도들이 평화로움 속에서 기도 드릴 수 있는 날만 기다립니다.”
그때 양 기사가 물 잔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다. “목사님, 혹시 서양 철학자의 말대로 신이 죽은 것은 아닐까요. 하고 많은 배 가운데서 하필 우리 배에서 그 많은 사람이 죽어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고통을 겪고 계시니 말입니다. 당장 내일 또 무슨 변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까지 오고 말입니다.” 양 기사의 뜬금없는 말에 유 목사는 흠칫 놀란 듯 바라보았다. 이런 상황이 되기 전에는 감히 입에 담지 못할 질문이었기 때문이었다. 유 목사는 애써 한 숨을 돌리더니 마음을 가라앉힌 다음에 입을 열었다. “니체가 그 말을 했던 것은 말이야, 신을 부정함이라기보다는 실존의 세계에서 인간의 역할과 존귀함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어. 지나치게 허상에 대한 집착을 경계하기 위함이었다고나 할까 뭐 그런 것이지. 그 말을 두고 신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은 무지의 소치일 뿐이야. 철학과 종교는 그 깊이가 끝이 없기에 이해하는 데에도 심오한 명상이 뒤따라야 하는 거야”
양 기사는 자신의 무리한 질문에 의외로 차분한 유 목사가 내심 놀랍기도 하고, 또 그 말이 현실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지금껏 들어온 설교와의 괴리감도 동시에 느꼈다. 감히 바라보지 못할 유 목사의 권위가 지금은 손에 잡힐 듯한 위치에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흐르는 사이에 휴대폰의 진동소리가 고요를 깨뜨렸다. 김 집사의 전화였다. 유 목사는 이때쯤 전화가 올 줄 알았다는 듯이 전화를 받았다. “김 집사, 저쪽에서 무슨 소식이 왔지?” 다급한 목소리로 묻자 김 집사 또한 쫓기는 듯이 급하게 말을 내뱉고 있었다. “목사님, 접촉해서 타협을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밀항에 필요한 배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작업에 경험이 있는 선주들도 워낙 국가적 관심 사안이라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맙니다. 해경과 해군에서 해안특별경계에 들어갔을 것으로 판단하고 꼬리들을 완전히 감춘 상태입니다. 정보기관은 목사님 안전을 보장한다고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만 오케이하시면 바로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 목사는 수많은 생각들로 눈을 지그시 감고 말았다.
신 선생을 불러 양 기사를 긴급히 별장으로 오도록 연락을 취하고, 신 선생은 별장을 떠나도록 시켰다. 앞으로의 일은 여자보다는 남자가 곁에 있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부랴부랴 김 집사에게 전화를 걸어 K실장에게 전화 연결을 지시했다.
K는 유 목사가 젊었던 시절부터 인연이 맺어진 사람이다. 오대양 사건에서 연루된 유 목사가 그나마 4년 만에 감옥을 나올 수 있도록 도왔고, 그로인하여 보은이 이루어지면서 커넥션이 형성되었다. 현 정권에서도 최고 권력자의 보호자 노릇을 하는 위치이기에 유 목사에게는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막강한, 인맥으로서는 최고의 믿을만한 언덕인 셈이다. 가장 소중하게 생명처럼 여기던, 노출되지 않은 핸드폰의 번호를 마지막 희망에 오픈 시켰다. 이제 유 목사의 위치는 세상을 향하여 완전히 열어 놓은 상태가 되었다. 하루가 지나도록 김 집사의 노력은 헛바퀴만 돌았다. K의 연결라인을 모조리 훑어나가도 회신이 없었다. “김 집사, 일을 그런 식으로 해서야 뭐하나 되는 게 있겠어? 정보기관 J차장에게 연결해 봐. 정보기관은 무슨 내용이던지 모조리 긁어 담는 속성이 있어. 내 소식이라면 개가 똥을 본 듯이 달려들 거야. 그리고 J차장은 옛날 주요사건 때 마다 K의 심부름꾼이었으니까 지금도 심복 노릇을 할 거야.” “그 방향까지 연결되면…….” “상관없어. 어차피 노출 됐어. 내가 알아서 처신할 테니 신속히 연결해.” “네. 잘 알겠습니다. 수단을 가리지 않고 연결해 보겠습니다.” 유 목사는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는 마음인 듯 비장한 표정이었다. 차를 처리하고 돌아와 집 안팎을 살피는 양 기사를 불러 부랴부랴 2층의 비밀공간으로 향했다. <다음에 계속>
구독 후원 하기
- 독자 여러분의 구독과 후원은 주간고령의 가장 큰 힘 입니다.
- 정기구독 / 일시 후원금액 : 자유결재
- 지면 평생 구독 50만원 / 연간 구독 5만원 / 월 구독 5천원
- 농협 301-0218-8409-31 주간고령
계좌번호 복사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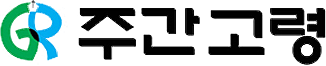



![[ 포토뉴스 ] 우곡면민 한마음축제 [ 포토뉴스 ] 우곡면민 한마음축제](http://www.weeklygr.com/data/file/news/thumb-662292049_73GUMhAr_d0a629b314c19e547601fbdba1fe21f8934d6b2a_190x1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