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 종 율(수필가)
지난호에 이어
눈앞에 지옥 같은 광경이 나타났다. 어린 것, 털 빠진 것, 눈에 진물이 흐르는 것 등 수십 마리의 고양이와 한 곳에는 치장한 옷조차 벗지 않은 애완견부터 숨을 헐떡거리는 늙은 도사견까지 우리에 갇혀 있었다.
‘저기 갇히면, 내 아이들이…….’
특히 막내는 남의 말에 졸졸 잘 따라다니기도 해서 여간 걱정이 아니었다.
우리가 왜 사람들에게 이렇게까지 홀대 받아야 한단 말인가.
아들, 손자, 며느리, 떼로 몰려가 채소밭을 망가뜨리기라도 했단 말인가. 사람들처럼 앙숙들끼리 모여 악다구니를 부리며 편 가르기 싸움이라도 했단 말인가.
‘보고 싶다, 일우, 이우, 삼냥아.’
검은 장갑의 손이 약간 느슨해질 때였다.
‘후다닥!’
“아니, 저, 저 녀석이…….”
앞만 보고 달렸다. 다리가 부러진 듯 아프고 코 위 상처가 욱신거리는 것쯤은 문제가 아니었다.
쫓아오는 목소리가 멀어지자 도착한 곳은 산속이었다. 도대체 여기가 어디란 말인가. 멀리 불빛들이 빛나고 있었다. 아, 우리 아이들이 있는 행복아파트는 어디쯤일까.
엄마를 기다리는 아이들의 그렁그렁한 눈밖에 보이지 않았다.
내겐 간직하고 있는 꿈이 있다. 시골에서 택배 할아버지와 우리 가족들이 같이 사는 꿈이었다. 할아버지도 나를 볼 때마다 다가와 털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우리 나중에 시골에 가서 같이 살자.”
‘어느 쪽으로 가야 한단 말인가.’
우선 큰길을 따라가야 했다. 행복아파트 가까이 백화점이 있으니 분명 그곳으로 사람들이 몰릴 것이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걸음을 옮길 때마다 손에 무엇을 들었는지 밖에 보이지 않았다. 신호등이 문제였다. 사람들보다 먼저 달려가거나 제일 나중에 가야 했다. 거긴 몸을 숨길 데 하나 없는 사막 같은 곳, 만약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갔다간 달려오는 차에 깔릴 게 뻔했다. 그런 소식을 간혹 들어 왔기에 나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떠난 적이 별로 없었다.
“엄마, 저기 도둑고양이가 지나가고 있어.”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아이가 엄마 손을 꼭 잡고 지나가고 있었다.
‘난 도둑고양이가 아니라, 엄마야.’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아이들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걷고 달렸지만 낯익은 길은 나타나지 않았다. 위를 쳐다보니 아파트 모두가 산속 키 큰 나무들처럼 모두가 비슷비슷했다.
‘이럴 줄 알았더라면 바깥 구경이라도 자주 해 둘걸.’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 얼마나 헤매었던지 눈이 어질어질하고 다리를 옮길 힘조차 없었다. 비까지 내리고 있어서 길가 쥐똥나무 밑에 잠시 앉아 쉬고 있는데 까만 열매가 아이들의 눈처럼 다가왔다. 눈물이 흐르며 스르르 눈이 감기기 시작했다.
‘지금 눈 감으면 안 돼.’
마음속으로 수없이 외쳤지만, 몸은 점점 수렁 속으로 빠져드는 느낌이었다.
가까이서 행복아파트 시계탑이 새벽 시간을 가리키며 빙그레 웃고 있었다. 꾸불꾸불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길이 직선으로 놓여 있었다. 트럭 옆에 아이를 안은 할아버지가 웃으며 어서 오라고 손짓을 하고 있었다. 음식을 가득 담은 그릇을 든 순희 언니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비야 어서 일어나.”
뒷다리를 일으켜 세우며 겨우 안간힘을 쓴다.
쏟아지는 빗속에도 털은 곧추세워져 있었다.
지나는 바람 한 점에 또 고꾸라진다.
눈을 번쩍 뜨니 아이의 목소리가 메아리가 되어 흘러나온다.
“엄마, 엄마, 엄마.”
<끝>
구독 후원 하기
- 독자 여러분의 구독과 후원은 주간고령의 가장 큰 힘 입니다.
- 정기구독 / 일시 후원금액 : 자유결재
- 지면 평생 구독 50만원 / 연간 구독 5만원 / 월 구독 5천원
- 농협 301-0218-8409-31 주간고령
계좌번호 복사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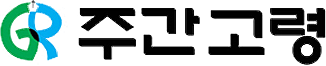



![[ 포토뉴스 ] 우곡면민 한마음축제 [ 포토뉴스 ] 우곡면민 한마음축제](http://www.weeklygr.com/data/file/news/thumb-662292049_73GUMhAr_d0a629b314c19e547601fbdba1fe21f8934d6b2a_190x1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