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지된 공간, 금지된 시간, 금지된 시선 ……
그녀는 지금 ‘금지’라는 벽 앞에 서서 자유를 꿈꾼다. 아무도 그녀에게 강요하지는 않았다. 다만, 그녀 스스로 구속했을 뿐이었다. 그래야만 한다고, 그러면 다들 알아줄 것이라고 믿었던 탓일 것이다. 마치 도덕교과서를 실천하듯 제1과를 이행하고 나면 다음엔 2과, 3과를 펼쳤다. 세월은 흘렀다. 세상도 변하고 그녀도 변해갔다. 자신을 옥죄었던 굴레들이 하나씩 가면을 벗고 진실의 모습을 드러내었을 때, 그녀는 아연실색했다. 그것은 배신감이었다. 사람에 대한 배신, 세상에 대한 배신, 이데올로기에 대한 배신이었다. 딸은, 엄마는, 아내는 자기를 내세워서는 안 된다는 가치를 지키고 살아온 세월에 대한 버림이었다. 이제 엄마도 엄마인생 좀 챙겨요,라는 아들의 말 앞에 그녀는 잃어버린 자신을 찾을 길이 없어 하염없이 가라앉았다.
그녀에게도 내일을 꿈꾸었던 창창했던 시간은 있었다. 산을 가면 초록이 되었고, 바다에 가면 파도가 되었다. 활어처럼 싱그러운 자신의 육체를 자신의 감정을 위해 채웠던 시간에 대한 기억은 다시 그렇게 살고 싶다는 희망을 갖게 하였다. 희망은 절망과 맞닿아있다 했던가. 문밖에 있는 현실은 절망의 동의어였다. 그녀에게는 이미 오래도록 자신을 조종했던 습관들이 있었다. 습관은 그녀를 통제하는 계율처럼 순간마다 그녀의 발목을 잡았고 매번 그녀는 넘어졌다.
누적된 습관은 의식도 잠식한다. 온 몸에 새겨진 타인에 대한 습관들은 오히려 그녀를 편안하게 했다. 그러나 이제는 타인을 위해 습관처럼 움직이고 나면 그녀는 아팠다. 스스로 벗어나고자 하는 의식과 누적된 습관사이에서 그녀는 종종 패배하지만 다시 자신을 추스르고 달랜다. 늦은 나이에 홀로서기는 쉽지 않다. 자신보다 타인에 대한 습관이 더 오래 쌓인 그녀에게 주체적으로 산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기만 하다.
누적된 습관은 의식도 잠식한다. 온 몸에 새겨진 타인에 대한 습관들은 오히려 그녀를 편안하게 했다. 그러나 이제는 타인을 위해 습관처럼 움직이고 나면 그녀는 아팠다. 스스로 벗어나고자 하는 의식과 누적된 습관사이에서 그녀는 종종 패배하지만 다시 자신을 추스르고 달랜다. 늦은 나이에 홀로서기는 쉽지 않다. 자신보다 타인에 대한 습관이 더 오래 쌓인 그녀에게 주체적으로 산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기만 하다.
아무것도 금지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금지된 것들은 즐비하다. 주체의 시선은 사라지고 자유만이 넘쳐나는 오늘날 끝없는 욕망만이 질주하게 한다. 타인의 아픔을 상상하지 않는 평범한 악마들이 넘치는 거리에서 비슷한 욕망을 주워 담으며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 전력질주 할 수 밖에 없는 문 밖의 현실은 여린 그녀에게 상처만을 주었다. 단지 목숨을 이어가고 싶지만은 않다는 욕망이 인간다운 삶을 원하게 한다. 자신에게 집중할 때 순간은 바스락거리며 다가온다. 꼼짝 않는 평온보다 치열함을 선택한 이상, 상처는 그녀에게는 훈장이다. 푸른 멍을 달고도 그녀는 흥성거리며 하루를 열어갈 것이다.
변화하는 계절 속에 살아있음이 감사하다는 내용의 메시지가 자주 도착한다. 그녀의 메시지를 열면 덩달아 흥겹다. 국화꽃을 찍어 보내고, 코스모스 속에서 활짝 웃는 그녀를 보내기도 하고, 눈 덮인 겨울 산에서 홧팅을 하기도 한다. 부지런히 돌아다니며 사진과 짧은 글을 보내오는 그녀는 계절 따라 물들고 있었다. 일에 파묻혀, 자식에게 매몰되어, 때늦은 공부로 책 속에 갇혀 있는 나에게 그녀는 노란주의보를 내린다. 빨간불이 켜지기 전에 고개를 들고 하늘을 보라고 그리고 너를 돌아보라고…….
변화하는 계절 속에 살아있음이 감사하다는 내용의 메시지가 자주 도착한다. 그녀의 메시지를 열면 덩달아 흥겹다. 국화꽃을 찍어 보내고, 코스모스 속에서 활짝 웃는 그녀를 보내기도 하고, 눈 덮인 겨울 산에서 홧팅을 하기도 한다. 부지런히 돌아다니며 사진과 짧은 글을 보내오는 그녀는 계절 따라 물들고 있었다. 일에 파묻혀, 자식에게 매몰되어, 때늦은 공부로 책 속에 갇혀 있는 나에게 그녀는 노란주의보를 내린다. 빨간불이 켜지기 전에 고개를 들고 하늘을 보라고 그리고 너를 돌아보라고…….
다시 봄이다. 살아있음이 아무 죄가 되지 않는 이런 날에는 맹목의 황홀한 죄 하나 짓고 싶다. 문현미 시인의 ‘사랑이 읽히다’에서 발췌
구독 후원 하기
- 독자 여러분의 구독과 후원은 주간고령의 가장 큰 힘 입니다.
- 정기구독 / 일시 후원금액 : 자유결재
- 지면 평생 구독 50만원 / 연간 구독 5만원 / 월 구독 5천원
- 농협 301-0218-8409-31 주간고령
계좌번호 복사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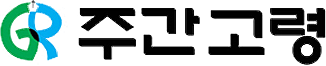



![[ 포토뉴스 ] 우곡면민 한마음축제 [ 포토뉴스 ] 우곡면민 한마음축제](http://www.weeklygr.com/data/file/news/thumb-662292049_73GUMhAr_d0a629b314c19e547601fbdba1fe21f8934d6b2a_190x1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