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万 折(문필가)
고향 얘기는 언제 해도 어머니 품속 같이 따뜻하고 푸근하다. 시대는 이른바 ‘글로벌’이고 지구촌 시대이니 고향이라는 한정된 관념에 메이는 것이 시대적 오류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고향이라는 고전적 의미의 순정(純正)함은 변치 않으리라.
사실 나는 행정상으로만 성주이지 고령이 성주 못지않은 고향이다.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언젠가 얘기했듯 어릴 때부터 5일장 고령장을 드나들었으니 ‘고령’ 글자만 봐도 고향생각이 떠오른다. 더구나 50여 년 전부터 고향 땅을 떠나 타지생활을 하다 보니 때로는 아련한 감회도 있었다.
얼마 전 귀지 기획기사 “우리마을 산책”을 접했더니 거기 덕곡면이 실렸다. 냇물만 건너면 고령 화암이고 수륜 계정동 닭목의 야트막한 재만 넘으면 고령 덕곡이니, 제일 먼저 노리(옛이름 노동)의 우리 외손 동평군 정종(鄭種)이 떠오른다. 동평군은 조선조 초 명필인 10世 선조 최흥효(호 月谷) 공의 사위이며 무관(武官·당상관)이다. 이징옥난과 이시애난을 평정하였으며, 이후 낙향하여 후학을 길렀으므로 이를 추모하기 위한 1930년 창건한 오로재(吾老齋)도 있었다.
또 가륜2리에 있는 나의 19세 선조 월주(月洲) 최진화(崔震華) 公의, 이 선조 공덕을 기리기 위한 월주재(月洲齋-1930년 창건)도 있었다. 재실이 있는 줄은 알았지만 이런 역사 기록이 있음에 감회가 좀 다르다.
정말 반가운 지명이 있었는데 서우재(鼠禹齋)였다. ‘서우재’를 다시 봐도 지난 날 처음 들었던 것과는 뭔가 좀 자연스럽지 않아 곰곰이 생각한 끝에 기억이 하나가 떠올랐다. 책가(冊架)를 뒤져 찾은 것이 1982년 고령군문화공보실이 발행한 “대가야의 얼”이었으며 거기 등재된 것이 ‘상비리(象鼻里·코끼리 코)와 서유재(鼠留齋·쥐가 머문다는)’였다. 다시 말해 주간고령에는 서‘유’재가 아닌 서‘우’재였으며 상비리는 없었다.
까마득한 옛날(1950년 전후) 초등학교 1,2학년 때 단골 소풍 가는 곳이 그때 말로 ‘쌩비리’였다. 그 골짜기에 들어서니 전후좌우 가파른 산들뿐이며 길옆 산록(山麓)은 깎아지른 듯하여 하늘은 겨우 반쪽만 보였다. 지상에서 바라 본 산세는 직각 절벽이 하늘을 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주간고령 ‘서우재’나 책자 상비리와 ‘서유재’의 그 어원(語源)의 유래는 대강 같았으나 책자는 더욱 세밀한 묘사였다. 물론 신문은 디테일(detail)함이 먼저이겠지만 말이다. 다만 지명 상비리를 쉽게, 편하게 쓰다 보니 쌩비리가 된 것은 아닌가 한다. 아마도 엄정한 계층사회인 조선 때 상비리의 ‘상’은 어쩐지 좀 비칭(卑稱)인 듯하여 ‘생’이 됐거나, 아니면 생은 또 된소리로 변하여 ‘쌩’이 된 것은 아닌가 한다. 역시 ‘상’은 복자음(複字音) ‘ㅆ’이 연상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쓰다 보니 ‘쌩’이 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이른바 나는 생뚱맞은 ‘식자우환’이 되겠지만 말이다.
변화되어 온 우리말의 연원(淵源)이 하나둘일까만 다만 생각나는 게 하나 있다. 조선시대 이른바 여럿 한량(閑良)들이 ‘매사냥’을 할 때 자기 매의 주인을 밝히려고 이름을 적어 발이나 꼬리에 붙이는 것을 ‘시치미’라 했는데, 그것이 변하여 알고도 모르는 체하는 ‘시치미 떼다’가 됐으며, 그래서 상비리가 쌩비리가 된 것은 아닌가 하는, 유추(類推)의 해석이다. 또 호랑이 ‘랑’을 접미사를 붙여 호‘랭’이’라 한 것도 그 예가 아닐까?
우리 일가 한 따님이 시집 간 동네 ‘새밤’이 있었고, 족친 한 동생의 처가가 있는 동네 ‘서우재’가 있어 느낌이 새롭다. 특히나 새밤이 무슨 말인지 모르다가 신율(新栗)임을 알았고, 서우재의 유래도 알게 됐으니 자그만 식견이지만 ‘아는 것이 힘’이라 하니 마음이 즐겁다.
끝으로 이름만 들어도 친근감이 가는 ‘덕곡’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게 하나 있다. 1960년대 초 논산훈련소에서 같은 내무반에서 훈련 받은 일가 최승곤(崔承·昇?坤)의 소식을 알고 싶다는 말이다. 일가이거나 소재(거처)를 알고 있는 계신 분은 꼭 연락(010·2707·6947)해 주시길 간청하며 이 글을 끝낸다. 그때 나눈 대화는 대구 매일신문사에 재직하다 입대한 것 얘기만 주고받았다. 참 아련한 기억에다 추억이다. 끝
구독 후원 하기
- 독자 여러분의 구독과 후원은 주간고령의 가장 큰 힘 입니다.
- 정기구독 / 일시 후원금액 : 자유결재
- 지면 평생 구독 50만원 / 연간 구독 5만원 / 월 구독 5천원
- 농협 301-0218-8409-31 주간고령
계좌번호 복사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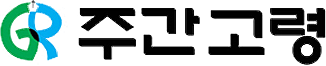



![[ 포토뉴스 ] 우곡면민 한마음축제 [ 포토뉴스 ] 우곡면민 한마음축제](http://www.weeklygr.com/data/file/news/thumb-662292049_73GUMhAr_d0a629b314c19e547601fbdba1fe21f8934d6b2a_190x1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