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아경(수필가)
지루해, 라는 친구의 문자를 읽고 한참을 들여다보았다. 지․루·해․라는 문자의 배열이 참하다는 생각을 한다. 읽고도 답이 없자 뭐해? 라며 다시 묻는다. 뭐라고 답해야하나. 지루해, 라는 글자가 참해라고 해야 하나, 너랑 문자하고 있잖아, 라고 해야 하나, 아니면 친구가 원하는 어떤 추상적인 문장 하나를 던져야 하나.
삶이 지루해, 다시 온 친구의 문자에 나는 정신이 화들짝 들었다. 지루한 것이 당연한 일상을 저토록 천착하며 표현하는 것은 친구의 일상에 균열이 생겼다는 투정이었다. 날마다 생기는 삶의 균열이지만 언제나 내 삶은 실금만큼의 균열이 생겨도 특별하기 마련이다. 내 말 좀 들어줘, 로 해석이 되지만, 나 역시 마음의 텐션이 낮아져 있어서 심드렁하게 대꾸했다.
감성이 잘 맞아 늘 그리워하는 친구지만 잘 만나지지 않는다. 함께 하는 모임이 없다보니 둘이서 문자로 공유하는 경우가 더 많다. 이런 저런 이유로 미루다가 장미의 붉은 빛이 담장을 둘러싼 오월, 금요일 밤에야 마주 앉았다. 국물이 자박한 갈비찜은 맛있었다. 연신 고기를 건져 먹는 내 옆에서 친구는 안주가 좋아서라며 소주와 맥주를 섞어서 첫잔을 마셨다. 건배만 하고 내린 나를 흘겨보더니 너에게 술 동지는 원하지 않았다는 표정으로 다시 소맥을 말아서 스스로 한 잔을 더 마셨다. 갈증이 났거든, 두 번째 잔의 이유였다. 자박갈비로 배를 채운 나는 이제야 친구의 빈 잔이 눈에 들어왔다. 금요일 오후는 누구나 허기져 있기 마련이다.
나는 배가 고팠고, 친구는 술이 고팠다. 허겁지겁 자신의 허기를 채우다 금방 배가 불렀고, 금방 취해 버렸다. 평소와 달리 술이 약해졌나, 친구는 고개를 떨구고 꼬인 혀로 마음 저 바닥의 소리를 하나씩 던져낸다. 마음에 안 들어, 다 마음에 안 들어. 독백처럼 반복하며 이번에는 소주를 마신다. 소주가 최고라나…. 술에 문외한인 나는 빈 잔을 채워주며 주류인생에 꼽사리 끼여 금요일 밤을 불태우고 있다.
딸이 사는 모습을 보고 와서는 마음이 아프다고 한다. 속 모르는 남들은 바다의 세계를 마음껏 노니는 삶을 동경하지만 일상은 동경으로 대체할 수 없는 작고 소소한 것들을 갖추어야 불편하지 않다. 그 작고 소소한 일상인 내 한 몸 편히 쉴 쾌적한 공간,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는 최소한의 생활비, 통신요금 같은 필수적인 공과금 납부가 체납되지 않을 정도의 경제력을 가져야 일상은 비로소 삶이라는 형태를 갖는다. 어떤 의미로든 규정할 기본적 세팅이 된 일상 위에서 결혼을 하든, 비혼으로 살든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
“나는 너무 가난해”
눈물을 쏟아낸다. 듣고 싶지 않은 말이었다. 가난이라는 말은 너무나 가난해서 듣는 사람조차 가난들게 한다. 친구의 등을 토닥이는 내 손이 초라하다. 위안이 될 그 어떤 단어도 찾지 못한 빈곤한 내 삶의 철학이 휘청거렸다. 자식에게 버팀목이 되고 싶은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엄마의 울음은 속절없이 슬펐다. 울컥 내 설움이 솟구쳤다.
“나도 너무 가난해”
서로를 향한 원망만 쏟아내는 관계 속에서 경청은 나의 유일한 역할이었다. 어느 순간 나의 임계점은 더 이상 경청을 허락하지 않고 내게 쏟아낸 그들의 감정들이 와르르 몰려왔다. 마음의 문을 닫고 나락으로 빠져들던 나의 가난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애증으로 적층된 시간들은 모두에게 상처만 주고 있다. 마음에 든 가난은 행복을 밀어낸다.
삶은 무형식의 생물이 아닐까. 지혜롭다는 이들은 숱한 해답을 제시하지만 보편일 뿐, 변수와 예외는 매순간 지뢰처럼 터져 세우지도 못한 형식을 무너뜨리고 만다.
와르르~무너지는 친구 옆에서 더불어 와르르 무너진다. 삶이라는 그 생물이 오늘은 내 친구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렸다. 날마다 세우고 무너지는 일상을 진솔하게 응시하는 친구의 모습은 한 편의 시이고, 그 친구의 힘겨움을 애써 공감하는 나는 한 편의 수필이었다. 제목은 와르르~~
구독 후원 하기
- 독자 여러분의 구독과 후원은 주간고령의 가장 큰 힘 입니다.
- 정기구독 / 일시 후원금액 : 자유결재
- 지면 평생 구독 50만원 / 연간 구독 5만원 / 월 구독 5천원
- 농협 301-0218-8409-31 주간고령
계좌번호 복사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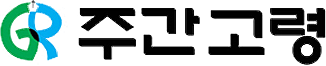



![[ 포토뉴스 ] 우곡면민 한마음축제 [ 포토뉴스 ] 우곡면민 한마음축제](http://www.weeklygr.com/data/file/news/thumb-662292049_73GUMhAr_d0a629b314c19e547601fbdba1fe21f8934d6b2a_190x1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