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 상 조<시인·소설가>
<지난호에 이어>
어이가 없다는 듯한, 멍한 표정의 지부장이 헛것으로 보였다가 사라졌다.
“이야! 민양 너, 배짱이 보통이 아니구나. 완전 장군 감이네.”
주인언니는 사태를 감지하고는 정혜에게 슬슬 비벼대기 시작했다. 통닭을 시키고 맥주를 사와서는 온갖 제 삶의 이야기들만 쏟아내다가 정혜 옆에서 잠이 들고 말았다.
다음날 아침, 잠든 주인언니를 깨우지도 않고 정혜는 일찍부터 짐을 정리했다. 짐이래야 커다란 가방 하나뿐이었다. 화장을 연하게 하고 옷도 제일 점잖은 것으로 골라 입었다. 오늘 일자로 다방생활을 마감하는 날인 것이다.
홀에서 약속된 전화를 기다리기라도 하듯이 정혜는 커피를 마시면서 전화기를 바라보고 있었다. 8시쯤이 되자 전화벨이 울렸다. 정혜는 수화기를 들고 점잖게 받았다.
“예, 희다방입니다.”
“아, 바로 받았구만, 민양! 어제 민양 태도로 보아 예사롭지도 않고 해서 밤이 늦었지만 군수님 댁에서 모여 가지고 의논을 했네. 오천은 너무 지나치고 삼천으로 해요. 그것도 이천은 나 혼자서 부담해야 돼. 날 봐서라도 좀 봐줘요, 응?” “예, 지부장님 말씀대로 할게요.”
정혜는 이미 끝난 전쟁이라 편하게 대답했다.
“그러면 경찰서 가서 자술서 받아오고, 이번 일로 일체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확인서만 써주고 내 사무실로 와요.”
지부장의 음성에는 안도의 느낌이 젖어있었다.
정혜는 가끔 배달 가던 개인택시 사무실로 전화를 해서 택시를 불렀다.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가방은 놔둔 채 택시를 탔다.
“어! 민양 어디 가는 모양이지?”
“아뇨, 오빠. 오늘 10만원에 내 비서 좀 해야 되는데……. 할래요?”
“아이구, 영광이라 생각하고 해야지. 자- 어디로 모실까요?”
“경찰서부터 가줘요.”
무슨 일이 있기는 있는 모양이다 싶어도 눈치 빠른 택시 기사는 묻지 않았다. 경찰서에서 깔끔하게 마무리를 한 뒤 지부장 사무실로 갔다.
1층 창구를 지나 2층으로 올라갔을 때, 지부장은 이미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서로가 오래 볼수록 힘든 입장이라 정혜는 수표를 확인하고는 마무리 인사를 했다.
“지부장님,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죠? 원래 확인서는 이 자리에서 써드려야 되는데, 그것까지 경찰서에 위임해 뒀더군요. 참 편리한 동네예요. 힘 있는 사람들끼리 소통이 아주 원활하게 이루어지니까요.”
뼈 있는 말을 한 뒤 정혜는 다시 “지부장님한테는 참 미안하네요. 잘 계세요.” 하고 목례를 했다. “악연도 인연인데, 다음에는 만나더라도 좋은 일로 만납시다.”
지부장의 말을 뒤로하고 사무실을 나서면서 정혜는 ‘일을 나쁘게 만들어가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마세요.’하고 얘기하려다가 입을 다물어 버렸다.
다시 다방으로 돌아오니 주인언니와 주방언니가 정혜의 가방을 옆에 두고 앉아있었다.
“언니, 내가 이곳에 머무를 수 없다는 것은 잘 아실 테고... , 벌금 이백에다가 영업정지기간 두 달 생활비 사백하고 육백 드릴게요. 두 달 휴가 받았다 생각하고 마음 편하게 가지세요.”
정혜는 일백만 원 권 수표 여섯 장을 건네주었다.
“주방언니는 저 때문에 일자리 잃었으니, 이백! 미안해요, 소란 피워서.” 수표를 받아든 두 사람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우물쭈물하고 있었다.
먼저 주방언니가 입을 열었다.
“아이구야, 살다가 온갖 일을 다 본다. 어쨌던 민양아 내까지 생각해주니 고맙다.”
“그러게, 이번 일을 보고나서 나는 민양이 한 없이 부럽다. 어쩜 그렇게 당당 할 수가 있는지……. 까짓 거 그래, 두 달 동안 민양 덕분에 푹 쉬지 뭐.” “자, 나는 갑니다. 오빠 내 가방 좀 들어 줄래요?”
“암, 오늘은 내가 비서잖아. 당연히 시키는 대로 해야지.” 목적지도 묻지 않은 채 차가 출발하자 정혜는 “오빠, 여기 혹시 고아원이 없나요?”
“고아원? 고아원은 없지 아마..., 그런데 규모가 작은 것도 고아원인지 몰라. 아이들 10명 남짓 있는데 자기 자식처럼 키운다던데. 정부보조금이 나오긴 하는데 형편없는 가봐.”
“오빠, 거기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알아요?”
“상세히는 모르지, 그런데 아이들한테 헌신적인 것만은 확실해. 거기 마을 사람들한테서 칭찬이 자자하니까.” “오빠, 그리로 가요.”
“응, 그런데 무슨 볼일이라도…….”
“가 보면 알아요.”
들길을 20여분 달려 작은 마을의 외곽에 위치한 목적지에 도착했다. 마당이 깨끗하고 꽤 넓었다. 아주 평범한 가정집처럼 꾸며져 있어 편안해 보였고, 아이들은 학교에 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정혜는 택시 기사에게 주인 소개를 부탁하고서는 능청스럽게 지나는 길에 차 한 잔 얻어먹고 싶어서 왔다고 했다.
“원장님이라 부르면 될까요?”
“예, 편하게 부르세요. 아줌마라고 부르는 게 저는 더 좋아요.”
60세는 되어 보이는 얼굴에 잔주름이 오히려 다정스레 보였다.
“그래도 원장님이라 부를께요. 저는 다방에 떠돌아다니는 보잘 것 없는 아이예요”
“아니, 무슨 말씀을... 보잘 것 없다니요. 어떤 삶이던 보잘 것 없는 삶은 없어요. 모두 다 귀하고 소중해요” 원장의 얼굴 표정에는 자학하는 정혜가 안타까워서 잔주름이 더 많이 잡혔다.
“원장님, 바쁘실 텐데 시간 뺏기도 그렇고 이만 가 볼께요. 이건 찻값이라 생각하시고…”
정혜는 봉투에 따로 넣어 두었던 일백만 원 권 수표 열장을 십만 원 쯤 되는 듯이 건넸다.
“아니, 갑자기 무슨 찻값이라뇨.” 한사코 거절하는 원장의 호주머니에 봉투를 넣어주고 정혜는 그 집을 나섰다. 다시 차는 도시를 향해 달리고 있었다. “민양, 다방에서 돈 받고 차 줬다고 저런데서 조차 찻값주면 그건 결례야”
“오빠, 그 차는 비싼 차니까 꼭 줘야 해요. 천만 원짜리 차를 마시고 그냥 나오면 안 되지”
“뭐! 그럼 민양 너, 진짜 천만 원을... 이야! 인물 났네, 인물 났어. 너 가지 말고 요다음 군수선거에 출마해라. 내가 참모해주께. 그건 그렇고 원장님은 지금쯤 놀라서 기절 했겠네”
짧은 시간이었지만 계속 따라 다니면서 봐 왔기에, 정혜가 거짓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란 걸 눈치 챈 기사는 흥분 되어 정혜를 우러러 보기 시작했다.
“아참, 오빠도 10만원은 가스비 빼고 나면 남는 게 없으니까 종점까지 20만원으로 재계약 해 줄께요. 그리고 군수 말이 나와서 말인데 내가 선물하나 할께요” 정혜는 가방 안에서 살색팬티를 꺼냈다. 짧은 가발 같은 털을 팬티 앞쪽에 붙여 놓은 것이었다.
“오빠, 이 팬티 가지고 있으면 교통사고도 안 나고 재수 좋은 일만 생길거야. 나도 이 팬티 때문에 삼천만원이나 벌었거든. 그리고 이 팬티를 본 남자는 이 세상에서 군수하고 오빠하고 두 사람 뿐이예요.
택시 기사는 당황스러운 일들을 굳이 짚어 보려 하지 않았다. 그저 기분이 좋아서 백미러에 팬티를 걸어두고 흐뭇하게 차를 몰았다.
“아참, 너무 바빠서 팬티 입고난 뒤 세탁은 못 했어요”
<끝>
구독 후원 하기
- 독자 여러분의 구독과 후원은 주간고령의 가장 큰 힘 입니다.
- 정기구독 / 일시 후원금액 : 자유결재
- 지면 평생 구독 50만원 / 연간 구독 5만원 / 월 구독 5천원
- 농협 301-0218-8409-31 주간고령
계좌번호 복사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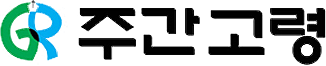



![[ 포토뉴스 ] 우곡면민 한마음축제 [ 포토뉴스 ] 우곡면민 한마음축제](http://www.weeklygr.com/data/file/news/thumb-662292049_73GUMhAr_d0a629b314c19e547601fbdba1fe21f8934d6b2a_190x143.jpg)










